[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교자성체라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가 개발됐다. 초고속,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유정우 교수팀과 물리학과 손창희 교수팀은 산화루테늄 교자성체 기반 자기 터널 접합 소자를 개발하고 이 소자에서 유효한 크기의 터널 자기저항(Tunneling magnetoresistance, TMR)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자기 터널 접합 소자는 MRAM 메모리 반도체를 구성하는 소자다. 현재 MRAM은 강자성체 자기 터널 접합 소자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비휘발성이고 전력 소모가 적으며 연산까지 가능한 AI 메모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유니스트. [사진=UNIST ]](https://image.inews24.com/v1/10e1d1aa6abdda.jpg)
MRAM은 전자의 ‘전하’를 이용하는 일반 메모리와 달리 ‘스핀’이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정보를 쓰고 읽는 방식이다. 강자성체라는 물질의 스핀은 반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스위칭 속도도 제한적이며, 외부 자기장의 간섭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자성체 기반 소자를 개발했다. 교자성체는 강자성체 소재처럼 스핀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외부 자기장에 영향을 덜 받고 초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소재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자성체 특성이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루테늄(RuO₂)을 활용했다. 이 물질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교자성체 후보로 거론돼 왔는데 실험적 특성을 두고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있다.
연구팀은 고진공 환경에서 원자 단위로 박막을 정밀하게 쌓아 산화루테늄을 합성했다. 절연층과 상부 강자성층을 차례로 증착해 자기 터널 접합 소자를 제작했다. 실제 이 소자에서 자성층의 자화 방향을 바꿨을 때 ‘터널 자기저항 값’이 변화되는 현상이 관측됐다. 터널 자기저항 값의 변화는 이 소자를 실제 자성 메모리 소자로 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증거다.
연구팀은 “교자성체 기반 자기 터널 접합 소자에서 스핀 방향에 따라 터널 자기저항 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교자성체 소자 기반 AI 메모리 반도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연구”라며 “터널 자기저항 값의 변화가 더 또렷한 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논문명: Tunneling magnetoresistance in altermagnetic RuO2-based magnetic tunnel junctions)는 UNIST 신소재공학과 노승현 연구원과 물리학과 김계현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물리학 분야 국제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6월 20일자로 실렸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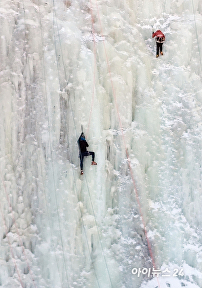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