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복잡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꺼지면 보행자와 자동차가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뇌도 정보 흐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나면 감정이 흔들린다. 심할 경우 우울증 등 정서질환이 생길 수 있다.
한국뇌연구원은 정서·인지질환 연구그룹 김정연 박사 연구팀이 뇌에서 ‘숨은 조절자’ 역할을 하는 특정 세포의 기능이 망가지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신호전달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스포리파아제C(PLC)라는 효소는 우울증, 간질,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PLC는 세포 안에서 칼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다양한 신호 전달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효소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중 PLCη1(PLC 에타1)의 구체적 생리학적 기능과 우울증과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강미선 박사후 연수연구원(공동 제1저자), 김정연 책임연구원(교신저자), 송석운 연구원(공동 제1저자). [사진=한국뇌연구원]](https://image.inews24.com/v1/aa591ae8989141.jpg)
김정연 박사 연구팀은 PLCη1 효소가 뇌의 외측고삐핵(lateral habenula, LHB, 뇌의 시상 상부에 위치한 작은 부위)에 있는 성상교세포(Astrocyte, 이른바 별세포라 부르며 신경세포의 학습, 기억 기능)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들이 과도하게 흥분해 우울증과 비슷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외측고삐핵의 성상교세포에서 PLCη1 효소를 제거한 실험동물모델을 활용해 뇌 기능과 행동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신호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 의욕 저하나 무기력과 같은 우울증 유사 행동을 보였다.
화학 자극을 통해 성상교세포에서 해당 효소를 활성화했더니 신경전달물질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우울증 유사행동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
스트레스 환경에 오래 노출돼 우울한 행동을 보이는 실험동물모델의 성상교세포를 관찰한 결과 PLCη1 효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PLCη1 효소가 사라지면 토닉 글루탐산(Tonic Glutamate)이라는 신경전달 신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가 과하게 흥분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토닉 글루탐산은 신경세포들이 기본 상태에서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과하게 흥분되지 않도록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교신저자인 김정연 박사는 “이번 연구는 외측고삐핵의 성상교세포에 존재하는 PLCη1 효소의 기능을 밝힘으로써 우울증 발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며 “신경전달물질 조절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 치료제와 달리 성상교세포와 PLCη1과 같은 조절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뇌연구원 송석운 연구원과 강미선 박사후 연수연구원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논문명: Role of Phospholipase Cn1 in lateral habenula astrocytes in depressive-like behavior in mice)는 Nature 자매지인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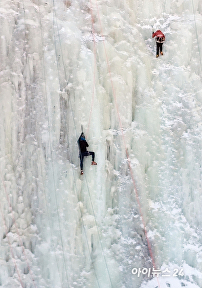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