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균성 기자] 리밸런싱(rebalancing)은 사전적 의미로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일’이다. 기업보다는 투자은행 쪽에 더 어울리는 용어다. 요즘에는 기업에도 ‘사업 구조조정’보다 이 말이 더 쓰이곤 한다. 언제부터 기업에서 구조조정보다 리밸런싱이란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난해 SK그룹이 선제적으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서면서 이 표현을 썼고 기업에서도 확산된 듯하다.
리밸런싱은 확실히 구조조정보다 어감이 부드럽다. 구조조정은 강제성이 부여된 느낌이고 그래서 다소 거친 뉘앙스다. 무언가에 쫓겨 다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느낌도 있다. 이와 달리 리밸런싱은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느껴진다. 원래 투자 은행 쪽에서 썼던 용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투자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략처럼 느껴진다.

국내 제조업체에겐, 그런데, 그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제조기업의 리밸런싱엔 자본 투자 효율 극대화 이상의 다급함이 묻어있다.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으로 보이는 SK만 봐도 그렇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알짜 기업도 매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매각한 SK렌터카, SK스페셜티 그리고 최근 매물로 나온 SK실트론 등이 대표적이다. SK이노 E&S 자회사 대치동 땅도 내놨다.
SK 뿐이 아니다. 급박한 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롯데와 나빠진 업황 때문에 고전하는 포스코, 최근에는 LG마저도 합류했다. 주로 한국 제조업의 중추 산업이었던 화학과 철강을 주력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들이다. 정부나 각 기업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도 마찬가지다. 화학 철강 배터리 가운데 2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더 어렵다.
두 용어의 의미를 잠시 곱씹어 본 까닭은 우리 산업의 현재 처지를 봤을 때 쓰라린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 위기가 그것이다. 그해 11월2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 체제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두가 분담해야 할 고통은 가혹했다. 그날 이후 기업은 줄도산했다. 당시 재계 3위였던 대우를 필두로 쌍용 동아 고합 아남 진로 해태 신호 뉴코아 거평 강원산업 새한 등은 그룹이 해체됐다.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회했다. 그해 12월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 발표되는 날 MBC 뉴스데스크 앵커인 이인용은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가히 국치일이라 할 만합니다.”
지금과 그때는 분명히 다르긴 하다. 외환 위기 원인이었던 외환보유고나 주요 기업 재무 건전성이 그때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외환 위기 교훈을 체화한 덕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굴기(倔起) 앞에 화학 철강 배터리 등 국내 제조업 전반이 바람 앞 등불 신세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 공급망도 크게 흔들렸다. 관세전쟁 탓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그때만큼 큰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그때와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이 확연히 다르다는 데 주목한다. 그때 한국 경제를 사람에 비유하면 청년기라 할 수 있다. 매년 10% 안팎의 고도성장을 이어가던 때다. 지금은 어떤가. 장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했고, 경제성장률은 급락했으며, 일 할 사람도 줄고 있다.
IMF 관리 체제를 당초 예정보다 2년8개월 앞서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리더십, 대기업간 빅딜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 수많은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금 모으기 등.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가 성장 경로상 청년기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지금의 위기를 더 우려스럽게 한다.
청년의 과욕이 부른 일시적 사고는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늙어 체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것도 다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그때보다 더 새로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대기업 그룹간 또 다른 형태의 빅딜이 요구되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강압에 따라 우리 첨단 제조시설이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생길 후환도 걱정거리다. 미국 제조업이 망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 산업 공동화(空洞化)는 공허한 우려일 리 없다. 자칭 영업사원 1호가 끼친 분탕질도 걷어내야 한다. 체력은 약해졌는데 조정해야 할 것은 산더미다. 다시, 선거철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성장을 말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외환 위기를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보다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 다시, 빅딜 등 거대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다.
/이균성 기자(sereno@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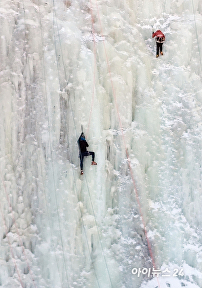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