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휴젤과 대웅제약, 메디톡스 3강 구도로 형성된 보툴리눔 톡신 시장 선점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상위 제약사 종근당그룹과 GC녹십자그룹까지 합류하면서다. 모두 국내를 넘어 중국 시장에서도 맞붙을 전망이다.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미지. 기사에 언급되는 기업들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a68ce1a1c5689.jpg)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는 15곳이며, 허가된 품목 수는 32개에 이른다. 그동안 휴젤의 '보툴렉스', 대웅제약의 '나보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3강이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종근당바이오와 GC녹십자그룹 등 다수 기업이 후발주자로 가세하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톡신에 집중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톡신은 의료 및 미용 분야에서 고급 시술에 분류되며, 단위당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진출 기업들은 균주를 명확히 함으로서 특허를 낸 뒤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특허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노화 방지와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톡신은 '캐시카우'로 자리잡고 있다.
이달 1일 종근당바이오는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티엠버스주 100단위'가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중등도·중증 미간 주름을 적응증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동물 유래 성분을 전면 배제한 비동물성 공정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알레르기 위험도 차단했다.
이는 종근당바이오가 유럽에서 톡신 균주를 도입한 지 6년 만의 성과다. 회사는 2019년 6월 유럽 소재 연구기관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균주를 확보했으며, 2023년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임상 완료 전에는 이미 수출용 100단위와 200단위 제품에 대한 허가도 취득했으며, 현재 일본, 홍콩, 러시아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제품에 사용된 균주의 출처도 명확하다. 티엠버스의 균주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GenBank)에 공식 등록돼 있어, 특허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종근당은 과거 휴젤 제품을, 현재 휴온스의 톡신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내수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유통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내 유통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앞서 종근당바이오는 2022년 1월 중국 큐티아 테라퓨틱스와 톡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국 현지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할 경우, 계약에 따라 향후 15년간 중국을 포함해 마카오, 대만 등에 제품을 공급을 할 예정이다. 중국에 톡신을 수출 중인 업체는 휴젤이 유일하다. 대웅제약은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메디톡스는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GC녹십자그룹이 자회사인 녹십자웰빙을 통해 에스테틱 기업 이니바이오의 경영권과 지분을 인수하며 톡신 시장 진출을 알렸다. 이니바이오는 스웨덴의 미생물 분양 기관인 CCUG에서 균주를 도입해 개발한 '이니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니보는 2023년 국내 품목허가에 성공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이니보주 100단위'의 품목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니바이오는 원활한 상업화를 위해 2022년 현지 에스테틱 기업과 3억7000만 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총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 유럽, 캐나다와 함께 4대 톡신 시장으로 꼽힌다. 2023년까지만 해도 4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해왔으나, 지난해 중국 정부가 톡신 제품 2종을 잇달아 승인하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은 △휴젤의 '레티보' △중국 란저우 'BTXA' △포순파마 '닥시페이' △미국 엘러간 '보톡스' △프랑스 입센 '디스포트' △독일 멀츠 '제오민' 등 총 6종이다.
성장 잠재력도 높다.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올해 중국 톡신 시장 규모는 126억 위안(약 2조4000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25.4%씩 성장해 2030년에는 390억 위안(약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이 2030년 106억2000만달러(약 14조원)에 이를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 특성상 집계되지 않는 비공식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톡신 기업들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는 판매 기업이 급증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대규모 수요가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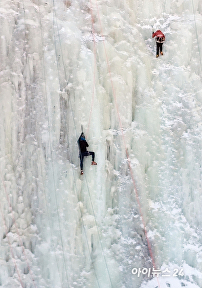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